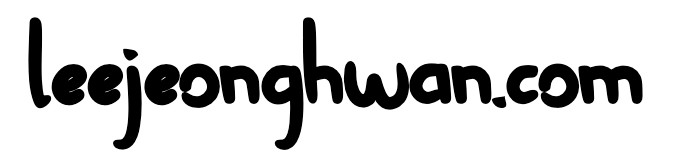노동부의 100만 해고대란설은 터무니없는 과장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 이후 1년 동안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근로자는 모두 38만2천명 밖에 안 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7월 한 달 동안 계약기간 만료자 1만9760명 가운데 계약이 종료된 사람은 37%인 7320명에 그쳤다. 노동부는 70% 이상이 해고될 거라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 역시 엉터리 예측이 됐다. 의도적으로 해고대란설을 부추겼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노동부는 거짓말이 드러난 뒤에도 이번 실태조사는 통계청 조사와 조사방법이나 시기가 달라서 차이가 있었다는 둥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둥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놓고 궤변에 가까운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은 36.8%에 그쳤다면서 나머지 26.1%를 ‘기타’로 분류하고 이들을 정규직 전환도 계약종료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는 빨간색 부분 26.1%를 ‘기타’로 분류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규직인데 일부 언론은 이를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평가절하 하거나 “법 위반” 또는 “편법 재계약” 등으로 비난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차라리 해고를 하라는 말일까.)
상황은 간단명료하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을 만들어 놓고 2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는데도 해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정규직이 됐다고 봐야 한다. 정확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데 이 말은 곧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노동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황을 정리해기는커녕 앞장서서 딴죽을 걸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노동부의 해고대란설을 지지해 왔던 일부 언론이 이른바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프레임으로 노동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이들 언론은 ‘기타’로 분류된 26.1%가 정규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나머지 26%, 시한폭탄”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법적으로 정규직인 이들은 해고가 쉽지 않아 기업에 부담을 주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법적으로 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여전히 해고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자가당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신문은 노동부의 해고대란설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악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겠으나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한 대학교수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문화일보는 한술 더 떠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법 위반’인줄 알면서도 기존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기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법 위반’이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펴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잘못된 법이라는 문제의 본질 자체에는 눈을 감은채 주변적 사안을 정략화해서는 안 된다”고 훈계를 늘어놓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2년이 지나고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를 “편법 재계약”이라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 본인도 자신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알고 있었다”면서 “법이 이처럼 심각하게 시장에서 외면받을 줄은 몰랐다”는 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런 편법 재계약이 성행하면서 해고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명과 함께 “시장상황을 반영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문화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법이 외면 받고 있고 사용자나 근로자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언론은 무작정 법을 없애자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이를 바로 알리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부동한 계약종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신문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오히려 법 위반, 편법 재계약 등으로 매도하면서 계약종료를 부추기고 있다.
보수성향 신문 가운데서는 조선일보가 조금 다른 논조를 보여 눈길을 끈다. 조선일보는 “예측 실패 인정하고 정책 다시 세우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부는 당연히 고용기간 2년을 넘긴 노동자는 정규직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근로감독을 펴야 한다”면서 “노동부가 이 사람들을 고용불안 상태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아무 때나 해고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경제지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물타기를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금처럼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상 사용주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남는 반면 근로자는 근로여건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고 가능성을 열어뒀고 한국경제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대량 해고사태’는 ‘절반의 해고’로 나타났고 노동계와 야당이 장담했던 정규직 전환효과도 미미했다”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기타로 분류된 26.1%를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셈인데 이들이 무늬만 정규직이라면 이들이 실질적인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건 ‘임금을 덜 줘도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들은 이제 쉽게 해고할 수 없는 신분을 얻게 됐지만 여전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떠나 단순히 숫자놀음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가 더욱 절실한 과제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