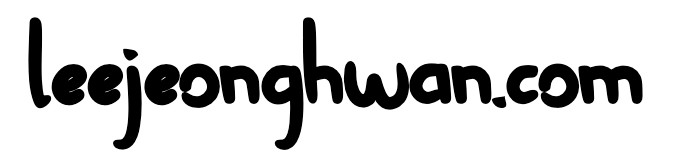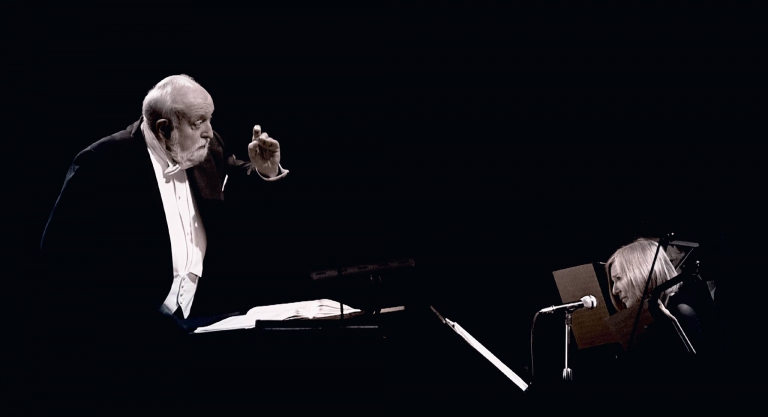정부가 공격적인 대책을 쏟아내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이르기까지는 걸림돌이 많고 자칫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우증권 고유선 연구원은 13일 발간한 “정부는 전지전능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리를 낮춰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고 양적팽창 정책이 자칫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을 뿐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다.
고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정상화된 뒤에도 한동안 부실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가계 역시 다시 부채를 늘릴 형편이 아니라 자산을 매각하거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계 부채가 많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과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 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라 과잉 생산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분석이다. 고 연구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각국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춰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주목된다. 경기 부양을 위
해 풀어 놓은 유동성이 원하지 않은 곳, 이를테면 상품시장 같은 곳으로 유입되어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되는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다. 고 연구원은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데다 기업과 가계 부문의 재정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한동안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제로금리에도 대출이 늘어나지 않았던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좋은 사례다.
고 연구원은 특히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증가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향후 민간 부실이 아니라 정부 부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일본은 정부 재정이 엄청난 적자였지만 민간 부분에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있었지만 미국이나 일부 유럽 나라들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인데다 재정악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 나라들은 모두 금리까지 바닥 수준이라 자금 유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국가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 축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실물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재정악화가 진행되고 있어 특정 나라의 재정 악화를 다른 나라에서 보전해주는 방식도 기대하기 어렵다. 고 연구원은 “재정정책이 안고 있는 잠재적 리스크와 구조적 부진 요인들이 많아 경기회복의 강도나 지속성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원은 “정부는 전지전능의 해결사가 아니라 조력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