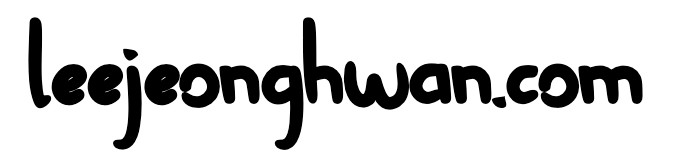통화 옵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키코 옵션라는 상품인데 키코(KIKO)는 락인(Knockin), 락아웃(Knockout)의 줄임말이다. 락인은 계약이 뒤집힌다는 의미, 락아웃은 계약이 해지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다. 옵션을 권리를 말하는데 권리가 가격 변동에 따라 권리가 의무로 뒤바뀌기도 한다.
키코 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일 경우 만기일에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정해진 범위를 밑돌 경우 계약이 아예 무효가 된다. 만약 환율이 급등해서 지정 범위를 웃돌게 되면 계약 금액의 2배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쉽다. 지금 현재 환율이 980원인데 약정환율을 960원로 하고 락인 락아웃 범위를 880원에서 1100원으로 설정하고 1억달러의 키코 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첫 번째 가정. 환율이 한번이라도 880원을 찍거나 그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환율은 떨어졌는데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 환율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걸 락아웃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가정. 환율이 880원과 1100원 사이에 머물 경우, 이를 테면 900원까지 떨어질 경우 당신은 만기일에 1억달러를 약정환율인 960원에 바꿀 수 있다. 시장 환율이 900원인데 960원에 바꿀 수 있으니까 1달러당 60원씩 이익을 본 셈이다.
또한 이를 테면 990원까지 오를 경우, 이때는 그냥 이익도 손해도 아니다. 990원에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시장 환율과 같기 때문에 그냥 본전인 셈이다.
세 번째 가정. 만약 환율이 1100원을 한번이라도 찍거나 뚫고 올라갈 경우. 이때는 무조건 약정 금액에 계약금액인 1억달러를 팔아야 한다. 이를 테면 환율이 1200원까지 올랐는데 약정환율인 960원에 팔아야 한다면 달러당 무려 60원씩을 손해보는 셈이다. 문제는 보통 키코 옵션의 경우 이 손실의 2~3배 이상을 물어주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만약 약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환율 헤지를 할 수 있지만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환율 하락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위로 뚫고 올라가면 환율이 올랐는데도 오히려 손실을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진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손실이 환율 상승분의 2~3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다분히 투기적인 파생상품에 투자한 기업들이 꽤나 많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아이디에이치는 올해 1분기에 2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도 1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295억원의 파생상품 손실 때문이다. 이밖에도 제이브이엠과 백산OPC, 디에스엘시디, 태산엘시디 등이 파생상품 손실로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도 당기순손실을 냈다.
키코 옵션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일부 기업들의 위험천만한 머니게임을 비판하는 동시에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 등 비교적 균형을 지키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파생상품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든 탓도 있고 금융기관들이 수수료에 눈이 멀어 일단 팔고 보자는 식으로 떠맡긴 측면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기꾼’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금융기관을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선물 환과 달리 키코 옵션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제대로 환율 예측도 하지 않았거나 애초에 할 능력이 없었고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와 강만수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 한국경제는 일부에서 비난하는 것과 달리 “반대 매매를 했기 때문에 0.01% 수준의 수수료 외에 은행이 가져가는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는 외국계 은행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일부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만약 법정까지 가져가더라도 이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핵심은 파생상품이 갖는 근본적인 위험이다. 기업들은 위험에 둔감했고 은행들은 위험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위험을 줄이려면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키코 옵션을 둘러싼 난리법석을 멍청한 기업 탓이나 무책임한 은행 탓으로 돌리고 나면 언젠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될지도 모른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는 파생상품의 위험은 여전히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키코 옵션은 애초에 환율 변동을 헤지하는 금융상품이 아니었다. 금융기관들은 철저하게 위험을 통제하면서 수수료만 챙기고 빠져 나왔지만 기업들은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환율 급등 이상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들 기업들은 환율 헤지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길 수 없는 무분별한 머니 게임에 말려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