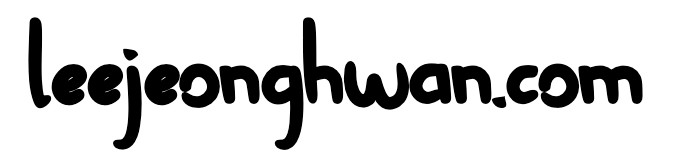‘댄스댄스댄스’에서 유키의 아빠 마키무라 히라쿠는 소설가다(이름도 비슷하다). 젊은 시절 놀라운 상상력과 힘이 넘치는 문장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지만 언젠가부터 그저 그런 시시한 글밖에 쓰지 못하고 희미하게 남은 재능의 그림자에 기대어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5년 만에 출간한 ‘1Q84’를 읽고 그 사람 생각이 났다. 하루키의 재능은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리고 이거 죄다 어디선가 읽은 느낌이잖아.
‘1Q84’의 후카에리는 ‘댄스댄스댄스’의 유키가 서너 살쯤 더 자란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하루키는 이들을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소녀들로 그리고 있는데 나이 차이 때문이겠지만 이들과 사랑에 빠지지는 않는다.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재능을 버거워하면서도 주인공을 다른 세계로 이끄는 영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건 운명처럼 예정돼 있고 피할 방법은 없다.
‘댄스댄스댄스’에서 유키는 주인공이 양 사나이를 만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린다. 키키를 죽인 사람이 고혼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유키다. ‘1Q84’에서 주인공 덴고는 후카에리의 소설을 고쳐 써주고 난 뒤 문득 자신이 1984년이 아닌 1Q84년이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다른 세상은 아마도 ‘댄스댄스댄스’에서 돌고래 호텔 16층에 있던 양 사나이의 어두운 방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루키의 여자들은 ‘상실의 시대’의 나오코처럼 자살을 하기도 하고 ‘태엽 감는 새’의 아내처럼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 ‘양을 쫓는 모험’과 ‘댄스댄스댄스’의 키키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기도 한다. 하루키는 ‘소멸된다’는 표현을 쓴다. 여자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코끼리가 소멸되기도 하고(단편 ‘코끼리의 소멸’) 도서관 지하 거대한 미로 안에 숨겨진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다(단편 ‘도서관에서 벌어진 기이한 이야기’).
하루키에게 1Q84년의 또 다른 세상은 우주의 반대편이 아니라 모퉁이를 돌면 맞닥뜨릴 수 있는 일상의 시공간이다. 그래서 빵을 훔치는 대신 바그너의 음악을 들어달라는 유혹에 넘어가거나(단편 ‘빵가게 습격’과 ‘빵가게 재습격’) 꽉 막힌 고속도로의 비상계단을 내려가거나(‘1Q84’)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잘못 누르는(‘댄스댄스댄스’) 것만으로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다만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현실의 경계를 부유하는 덴고에게 아오마메는 유일한 욕망의 대상이다. ‘댄스댄스댄스’의 유미요시나 ‘상실의 시대’의 미도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키는 사랑이 해피엔딩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애초에 행복한 결말 따위는 없다는 걸 하루키도 알고 독자들도 안다. 어쩌면 양 사나이가 충고한 것처럼 “계속 춤을 출 것”, 택시 기사가 경고한 것처럼 “현실은 결국 하나 뿐”이란 걸 깨닫는 게 현실을 이겨내는 유일한 해법일지도 모른다.
하루키는 그의 소설 여기저기에서 1968년 전학공투회의(전공투)의 기억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 기억은 상실의 흔적을 더듬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자기연민,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1Q84’에서 하루키는 전공투를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아오마메가 ‘선구’의 교주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모호한 경계에서 하루키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당신은 아는가”라고 묻는다.
하루키는 조지 오웰의 ‘1984’와 1995년 옴 진리교 사건을 모티브로 ‘1Q84’를 썼다고 밝힌 바 있다. ‘1984’의 ‘빅 브라더’가 거대권력의 감시와 통제를 의미한다면 ‘1Q84’의 ‘리틀 피플’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집단 무의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루키가 ‘리틀 피플’을 “마르크시즘을 대체할 좌표”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가 일관되게 거대담론을 거부하면서 다소 냉소적인 태도로 일상적인 가치에 몰입해 왔음을 돌아보면 그리 낯설지 않다.
하루키의 주인공들은 일탈을 꿈꾸지 않는다. 오히려 끊임없이 현실을 긍정하고 견뎌낸다. 하루키의 소설이 갖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1Q84’에서는 가뜩이나 모호했던 경계가 무너지면서 현실과 몽상이 뒤섞이는데, 물론 이 책이 그럭저럭 재미있고 한번 손에 들면 밤새 읽게 된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징을 남발하면서 지난 소설을 주섬주섬 짜깁기하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데 그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