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적자가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는 당면한 현실이다.
그런데 18일 매일경제가 1면 “줄줄 새는 건보료 또 올려야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제목만 봐서는 보험료를 올리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올리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보험료가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내년 건강보험공단의 적자는 2조2000억 원, 2010년이면 3조7000억 원, 2011년이면 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결국 이 적자를 메우려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매일경제가 지적한 보험료가 줄줄 새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약을 정량의 수십배씩 처방 받는 사람들. 이 신문은 수십군데 병원에서 정량의 30배에 이르는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은 70대 김아무개씨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 신문은 정부가 차상위 계층의 의료 급여를 건강보험에 떠넘겨 가입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관리 부실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같은 과잉진료는 일부의 사례일 뿐 재정적자의 근본원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지난해 6월 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2030건,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이보다 5배 가까이 많은 1만458건이다. 상당한 규모인데다 보험료 타내기에 급급한 일부 병원의 도덕적 해이도 의심스럽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를 정부가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를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바로 윗 등급의 저소득 계층을 말한다. 올해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이 건강보험으로 흡수되고 내년부터는 만성질환과 18세 미만 아동이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흡수된다.

매일경제는 7면에 “건보재정 자기 돈처럼 털어가는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있다. 국민들 돈으로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가 자기 돈처럼 털어간다”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지나치지만 애초 공적 보험의 사회적 부조 역할과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무시한 몰상식한 발상이다. ‘내가 낸 보험료로 왜 보험료 한푼도 안 낸 그들을 지원해주느냐’는 유아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관리부실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기업의 비효율과 관리부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선해야겠지만 논의의 본질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특히 “암에 들어간 보험급여가 1조6000억 원인데 감기에는 1조4000억 원이 소요됐다”는 등의 비판도 적절치 않다. 중증질환의 부담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증질환의 급여를 줄여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를 두고 과도한 의료 이용이나 관리 부실을 문제삼는 것도 적절치 않다.

(전체 의료비 지출 가운데 공적보험 부담 비율. 우리나라는 뒤에서 세번째다. 미국과 멕시코가 우리 뒤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해법은 결국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를 알면서도 변죽만 울리고 있다. 더 현실적인 해법으로는 보험료의 누진 비율을 강화하거나 보험료 상한을 높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과 관리부실은 당연히 개선해야 하고 일부 환자들과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바로 잡아야 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결국 환자들의 혜택으로 돌아온다. 적자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적자를 충당할 재원을 확보해 재정을 확충하거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08%, 독일은 14%, 프랑스는 13.55% 수준이다. 공적 보험의 의료보장 수준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이 8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53%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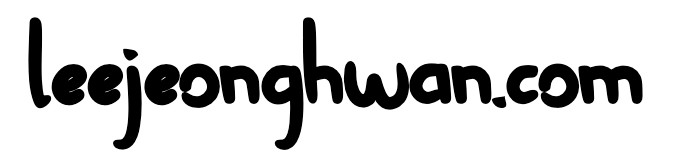
아~ 훌륭합니다.
저도 저렇게 생각하고있었거든요.
왜 우리나라 정부는 건강보험을 복지라고생각안하고 사업이라고 생각할까요?
신기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