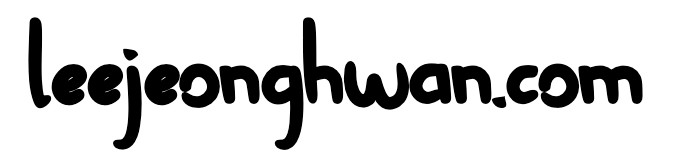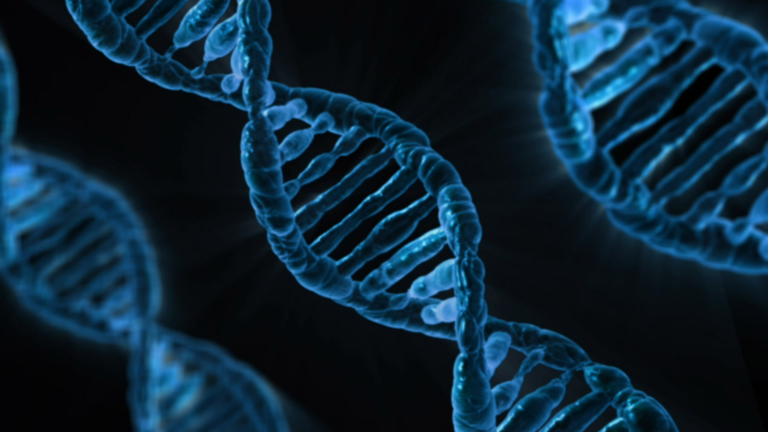또 한차례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인가. 최근 금융시장에 떠도는 이른바 9월 위기설은 공연한 우스개 소리로 흘려듣기에는 그 근거가 꽤나 구체적이다.
먼저 6월 말 기준으로 가계 부채가 640조 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68%에 육박하고 있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 최근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이자상환능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경기도 우려스럽다. 이 역시 가계 부채와 무관하지 않은데 이미 주택 가격이 연 소득의 6∼7배에 이를 만큼 오른 뒤라 크게 더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분양 주택이 13만호에 이르는 데다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이 32만 호로 지난해보다 많고 전셋값도 하락하는 추세라 한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이 가계 부실과 중소기업의 재정 악화,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올해 3월 기준으로 73조 원, 전체 대출 자산의 25.7%에 이르는 등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자칫 지방 미분양 사태가 중소 건설사들과 저축은행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국제 경제도 심상치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확산되면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GDP 대비 원유 수입 비중이 13∼17% 정도로 유가 급등의 충격이 크다는 점도 위기감의 원인이다.
최근 정부가 환율 개입에 나서면서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외환보유액 역시 걱정거리를 더한다. 다음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국인 보유채권은 8조6천억 원 규모. 이 가운데 2조 원 정도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고, 6조 원 정도가 남은 상태다. 이 돈이 일시에 나갈 경우 금융시장에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 9월 금융위기설의 절정이다.
최근 언론 보도는 시중에 떠도는 위기설을 단순 중계할 뿐 그 근본 원인을 짚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수준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일부 경제지들은 건설회사들 연쇄 부도 가능성이나 조선업계 수주 물량 취소 여파 등을 확대 해석하면서 감세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애꿎은 노동조합 파업이나 촛불시위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도 눈에 띤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위기설은 다분히 과장된 측면이 많고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먼저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고 중소 건설회사들 부실도 일부 저축은행의 부도에 그칠 뿐 전반적인 금융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금융기관들 충당금 비율도 높고 레버리지 수준이나 유동화 비율은 낮아 애초에 미국의 위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외환보유액 또한 아직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대우증권 고유선 연구원은 “구조적인 금융위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및 성장세 둔화와 금리 상승효과를 반영한 순환적 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원은 그러나 “저소득 계층의 경우 이자 상환에 쓰일 흑자 규모가 충분치 않아 연체율 상승 추이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성장 둔화의 근본 원인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도 주목할 만하다. CJ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소비 양극화가 성장 모멘텀 둔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