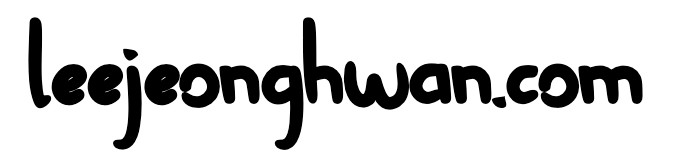얼마 전에 ‘광파리’라는 아이디로 유명한 김광현 기자를 만났다. 그는 한국경제 전략기획국에서 일하다가 최근 정보기술 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시 편집국으로 내려갔다. 그는 블로그를 하려고 술과 골프를 끊었다고 했다. 블로그 할 시간도 없는데 주말에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기업 홍보 담당자들과 술 마시고 골프 치면서 정보를 주고 받고 기사와 광고를 거래하는 후진적인 취재 관행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만났을 때만 해도 편집국에서 왕따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더니 최근 그는 한국경제의 지면 쇄신을 주도하고 있다. 나이 지긋한 중견 기자지만 그의 감각은 웬만한 젊은 기자들 못지 않다. 다른 기자들이 KT와 SK텔레콤 입장에서 기사를 쓸 때 그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기사를 쓴다. 멀리 내다 보고 통신 산업의 큰 흐름을 짚어낸다. 독자들이 그의 기사에 열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물론 한국경제는 쉽게 바뀔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주주로 있고 수익기반은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경제지들의 극단적인 성장주의와 시장만능의 논리는 이런 물적 토대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깨어있는 기자들, 현상의 이면을 파고 들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기자들이 늘어날 때 의미있는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 기술의 진보가 이런 변화를 추동한다는 게 놀랍다.
매경-한경 모바일 대전 뜨겁다.
서로 “우리가 최고”… 편집국 지면 쇄신도 가속화.
국내 양대 경제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모바일 전략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업데이트하는가 하면 모바일과 뉴미디어 관련 지면을 대폭 늘리고 블로그와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연일 “우리가 국내 최고”라는 기사를 쏟아내는 등 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두 회사 모두 편집국 실무진 보다는 상부 경영진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매일경제는 장대환 회장이 3년 전부터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모색하고 모바일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는 등 뉴미디어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는 김정호 편집국장이 부장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편집국 시스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국장의 지론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매일경제가 훨씬 앞섰다. 매일경제는 일찌감치 지난해 10월부터 아이폰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다운로드 건수도 15만건이 넘어 국내 언론사 가운데 1위다. 매일경제는 ‘최초’와 ‘최강’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반면 한국경제는 반년이나 늦게 4월 들어서야 아이폰 앱을 내놓았다. 회장 주도 아래 발 빠르게 움직이는 매일경제와 다소 신중하지만 꼼꼼한 한국경제, 두 회사의 차이는 인터페이스와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늦게 나온 만큼 전반적으로 완성도는 한국경제가 높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경제는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카테고리를 손쉽게 넘겨볼 수 있도록 한 다이얼 형태의 메뉴 버튼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나온 국내 언론사 가운데 가장 편리한 인터페이스다. 상단을 넓게 차지한 시원시원한 썸네일 이미지도 목록만 늘어놓는 형태의 다른 언론사 앱과 차별화된다. 종이신문 형태로 볼 수 있는 지면보기 서비스도 넘겨보기 편리하게 돼 있다.
매일경제는 출시 이후 별다른 업데이트가 없어 밋밋한 디자인이지만 빠른 업데이트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지난달부터 업데이트 주기를 5분에서 2분으로 줄였다. 기사를 트위터로 전송할 수도 있는 기능도 있고 주요 뉴스를 초기화면에 문자 메시지처럼 띄워주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도 제공된다. 향후 업데이트에서는 매일경제도 지면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지면보기 서비스를 유료화한다는 계획도 서 있다.
단순히 아이폰 앱 출시 뿐만 아니라 변화는 편집국 전반에 걸쳐서 시작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기존의 정보기술팀을 모바일부로 확대 개편했다. 모바일부는 취재팀 5명과 R&D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유진평 팀장은 “통신 3사가 이동통신 3사가 된지 오래고 인력의 절반 이상을 모바일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제지에서도 정보기술팀 기사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기사”라고 지적했다. 취재 시스템의 개편도 필수 불가결했다는 이야기다.
한국경제는 최근 전략기획국에 있던 김광현 부장이 정보기술 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편집국으로 내려가 지면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광파리의 글로벌 IT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김 부장은 지난해 10대 기자 블로거에 선정되기도 했다. 블로그 때문에 술과 골프를 끊었다는 김 부장은 기존의 기사 문법을 깨는 탈 권위적이고 혁신적인 스토리 텔링으로 기존의 한국경제 독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독자 계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경제에는 김 부장 뿐만 아니라 임원기, 조재길, 최진순 기자 등 블로거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기자들이 많다. 한국경제는 ‘올해의 한경 블로거 상’을 제정하는 등 기자들의 블로그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진순 기자는 “일련의 뉴미디어 실험으로 기자들도 한껏 고무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기업과 광고주를 위한 기사를 썼다면 이제는 독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무엇을 읽고 싶어 하는지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다.
매일경제도 국내 최초로 기자들 바이라인 옆에 트위터 아이디를 명기하는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 팔로워 숫자는 400명이 조금 넘는 정도다. 유진평 팀장은 “기사로 쓰지 못하는 이야기를 트위터에서 털어놓는다는 게 낯설고 어색하지만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뭔가 써야겠다는 책임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최근 소셜 미디어 전문가인 태터앤미디어 이성규 팀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언뜻 블로그 포스트 같은 기사가 1면 머리기사로 올라오기도 하고 정보기술 마니아들이나 좋아할 만한 포스퀘어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소개되기도 하고 전문가도 아닌 불특정 다수 누리꾼들의 의견이 지면에 등장하기도 한다. 기자들도 이제 그들과 뒤섞여 소통의 일원이 된다. 전통적인 지면 편집 원리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독자들은 이 새로운 실험에 열광한다. 인터넷 등장 이후 멀어졌던 독자들이 모바일을 통해 다시 돌아올 것인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