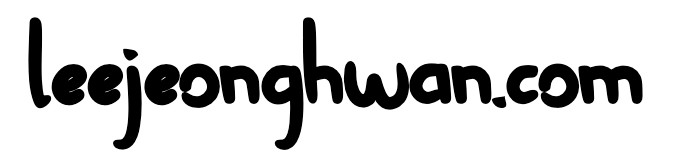“아파트도 상품인데 비싸서 안 팔리는 걸 왜 언론이 나서서 걱정을 합니까.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야죠. 안 팔리는 아파트를 무리하게 짓다가 부도가 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의 이야기다. 김 본부장은 “언론이 언제 영세 자영업자들 연쇄부도를 진지하게 고민해봤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전매 제한이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미분양 사태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건설업체 연쇄 부도를 이야기하고 불똥이 금융권까지 튀어 자칫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파이낸셜뉴스는 14일 15면 머리기사 “‘있으나 마나’한 분양가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당초 기대했던 성과는 못 내면서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이 사례로 든 남양주 진접지구를 살펴보자. 분양가 상한제가 최초로 적용된 이 아파트는 3.3㎡에 700만원 미만일 걸로 예상됐지만 75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양주 고읍지구의 경우는 3.3㎡에 87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파이낸셜은 높은 분양가를 비판하기 보다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효성이 없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예 높은 분양가를 방치하자는 이야기다. 파이낸셜은 “억지로 분양가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품질 하락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매일경제는 전매제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14일 1면 머리기사 “전매제한 10년, 논란 본격화”에서 “전국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로 신규는 물론 기존 주택 거래마저 단절되고 있다”며 “사유 재산권과 주거 이전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매경은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사정이 다른 지방에까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해 미분양 사태를 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조차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공급 과잉에 한몫했다”고 덧붙였다.
매경은 이어 29면 “아파트 대출규제 풀어야”에서 건설업계의 요구를 자세히 전달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물론이고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늘리거나 감면해 줄 것,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을 조속히 해제해줄 것, 주택사업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해줄 것 등이다.
문제의 핵심은 매경도 지적하고 있듯이 주택보급률에 있다. 주택보급률이 경기도만 99.4%일뿐 다른 모든 지역이 110%가 넘는다. 전남는 138.9%, 충남은 133.8%, 강원은 130.9%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니 아파트를 지어도 팔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대출 규제를 풀고 양도세를 감면해 투기를 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요 부진을 투기 수요로 메우겠다는 발상이다.
동아일보는 14일 B2면 이코노카페 “주택업계 줄도산 정부 책임 없나”에서 “정부가 뒤늦게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매를 제한하자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사들은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지방에도 대출 규제를 가하자 그나마 남아있던 유효수요마저 고갈되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미분양 사태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부실 우려도 논란의 대상이다. 건설업체들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옮겨오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B3면 머리기사 “부동산 PF, 한국판 서브프라임 뇌관되나”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가 은행권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13일 16면 머리기사 “살얼음판 건설 PF, 금융권에 불똥 튀나”에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돼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시공사가 넘어가면 건설사가 이 미수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영록 재경부 1차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부실 우려가 크지 않다”고 해명한 부분도 이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임 차관은 “저축은행 등에 대해 총 여신 가운데 PF 대출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했고 연체 기준도 강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우리나라의 PF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파생상품이 복잡하게 연결된 서브프라임과 달리 PF는 단일 사업장의 부실로 끝나기 때문에 금융권의 연쇄 부실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국민일보는 13일 14면 “PF, 한국판 서브프라임 되나”에서 “금융당국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일보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부도가 확산되면 저축은행은 물론 금융권이 상당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13일 B1면 “주택업계 ‘줄도산’ 현실화”에서 “연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주택업체들의 부도사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언론의 미분양 사태를 보는 관점은 다분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비싸서 안 팔리는 아파트를 정부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도 집값이 계속 뛰어오를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수요가 몰리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겨우 안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집값을 언론이 다시 띄우려 하고 있다. 한동안 건설업체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이 계속될 것이다. 이들을 핵심 광고주로 두고 있는 언론이 이들의 고통에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한겨레는 13일 19면 머리기사 “대박 즐기던 부동산 PF, 금융부실 제발등 찍나”에서 “최근 건설사들 부도는 부실이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은데도 금융회사들이 미리부터 잣대를 너무 경직적으로 들이댄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맞물린 서브프라임과 우리의 상황은 출발점도 다르고 심각성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분양 사태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아파트 값은 다음 네 단계를 거치면서 터무니없이 부풀려진다.
첫 번째 단계는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다. 개발계획이 알려지면 땅값이 치솟고 땅 주인들이 돈을 번다. 정부가 나서서 땅값이 오를 거라고 실컷 광고하고 난 뒤 땅값이 오르면 보상비를 마구 퍼주고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집값에 반영된다.
두 번째 단계는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그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다. 택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건설업체에 넘겨줄 때는 터무니없이 값이 뛴다.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정하게 한 것도 택지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요인이이다. 주변 시세에 따라 얼마든지 택지 공급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다. 건설업체들이 건축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는 가산비용이다. 가산비용이란 지하층 건축비용과 분양 보증 수수료, 복리시설 설치비용 등을 말하는데 그야말로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다. 여전히 주변 집값보다는 싸기 때문에 당첨자들은 대박을 터뜨린다. 5~10년까지 전매 제한이 걸려있어도 큰 이변이 없다면 전매 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그 과정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덩달아 뛰어오르고 새 아파트의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연쇄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세 번째 단계, 전매 제한은 네 번째 단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다.
가뜩이나 최근 미분양 사태는 이런 규제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애초에 공급 과잉의 문제일 뿐, 그리고 분양가가 수요를 끌어낼 만큼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 이상 미분양 사태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회사들의 연쇄 부도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공급을 늘린 탓이라고 보는 게 맞다.
수요를 만들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도 거품을 빼야 한다. 주택 보급률이 110%에 이른다는 사실은 건설업체들의 좋던 시절이 다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 거품을 빼지 않고 수요를 살릴 방법은 없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싼 아파트를 분양하는 만큼 일부에게 특혜를 몰아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전매제한 제도 역시 여전히 필요하다.
이정환 기자 top@journalismclass.mycafe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