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매일경제에 실린 “이상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는 제목의 칼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칼럼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언론의 얕은 문제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간단히 진단을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퇴원을 했다. 그런데 의사가 며칠 뒤 정밀진단을 받아보자고 한다. 어차피 치료비야 가해자 쪽에서 대니까 부담은 없다. 그래서 과잉 진료를 받게 된다.
매일경제의 문제 제기는 건강보험으로 이어진다. 자동차 보험은 이런데 왜 건강보험은 제대로 된 진료를 못하느냐는 것이다. 매일경제는 한 외과의사의 말을 인용, “새로 개발된 수술을 하면 흉터가 남지 않아 비싸지만 추천하고 싶지만 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시도할 수가 없다”고 전한다. 매일경제는 “참으로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매일경제는 문제제기는 정확했지만 정작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장 진료비가 늘어나니 과잉 진료라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대부분 의사들과 환자들은 관행적으로 이왕이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더 질 낮은 진료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 해법은 무엇일까.
일단 자동차 사고에 과잉 진료가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진료비가 공짜라서다.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밀 진단이든 뭐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양할 이유가 없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입원이라도 하고 최대한 보상금을 받아내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도 나오고 사고 한번 잘못 내면 이듬해 터무니 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치솟기도 한다.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드러누워 병원비를 받아 챙기고 그 비용을 상대방의 보험료에 전가시키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또 다르다. 자동차 보험이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면 건강보험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보험이다. 급여가 되는 항목과 되지 않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보험 급여를 받으면 진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급여가 안 되는 항목이라면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가 무엇일까.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고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을 나눠먹기 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최대한 보장을 받아내려고 하고 보험회사는 고스란히 그 부담을 가입자에게 떠맡기게 된다. 여기에서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된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드러눕게 되고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은 보험회사들 배만 불리게 된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비유도 적절하다. 집집마다 마음껏 소를 풀어놓으면 풀이 새로 자랄 시간이 없어 결국 공유지가 황폐화 된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환자나 병원이나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정부 보조를 받는 상황에서 재정 수지를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한쪽에서는 과잉진료가 문제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진료를 제대로 못 받거나 보험혜택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다. 과연 자동차보험이 정상인가, 건강보험이 정상인가.
똑같이 다치더라도 내가 낸 사고일 때는 마음놓고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 상대방은 일단 드러눕고 보는데 나는 병원비와 보험료 부담이 걱정돼 퇴원을 해야 한다. 상대방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후유증을 걱정하지만 나는 병원비부터 걱정해야 한다.
피해자 역시 억울한 경우가 많다. 나이롱 환자도 문제지만 정작 진짜 환자를 나이롱 환자 취급하면서 병원 밖으로 내모는 일도 동시에 벌어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험회사가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환자를 보험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일도 있다. 후유증을 안고 보험회사와 소송을 벌이느라 기진맥진한 피해자의 경우도 흔하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왜 보험료를 제때 다 내고도 어떤 질병은 보장이 되고 어떤 질병은 안 되는 것이며 보장이 안 되는 질병은 집안을 다 말아먹을 만큼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일까. 최근 논란이 되는 것처럼 과연 가벼운 질병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중증 질병만 보장하는 것이 옳을까. 이 경우 가벼운 질병조차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 계층은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법은 건강보험을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무상의료 또는 그에 가까운 복지 수준을 확충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 교통사고든 다른 일반 사고든 다른 어떤 질병이든 누구나 최선의 진료를 받고 사회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이 되면 굳이 나이롱 환자가 돼서 병원에 드러누울 이유가 없다.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을 막는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고 일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확대된 복지 혜택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다.
자동차보험이 죄수의 딜레마의 문제라면 건강보험은 아예 판을 깨려는 복지 이탈자들이 문제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더 많이 내야 할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거부하고 정치권은 이들의 눈치를 본다.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고 건강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험회사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갖다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진다. 보험회사들은 내친 김에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들 반발을 의식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를 모두 더하면 전체 의료비 지출의 세배가 넘는다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험료의 3분의 1만 내도 완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이른바 능동적 복지는 애초에 모순을 담고 있다.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도대체 복지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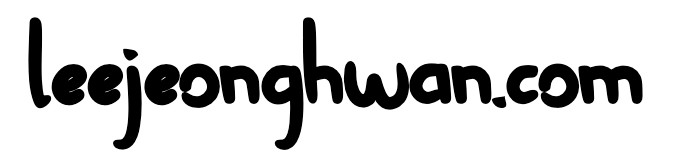
마지막 통계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1년동안 의료보험료 전체가 1년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출한 전체 의료비의 3배라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