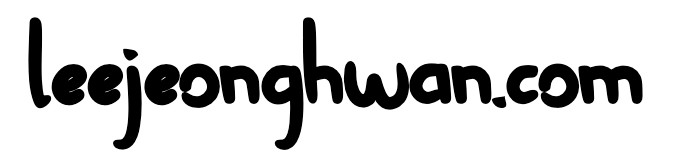경직된 비폭력을 넘어… 밤샘 토론으로 끌어낸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70만이 모였다는 10일 촛불집회는 한달 이상 계속된 지난 집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6월 항쟁 2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순서가 있긴 했지만 몇차례 자유발언과 노래와 구호가 끝나고 시민들은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서대문을 지나 독립문 앞 사직터널까지 행진한 시민들은 늘 그랬듯이 경찰의 차벽을 맞닥뜨리고 발길을 돌렸다. 종로방향으로 행진한 시민들 역시 조계사 삼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세종로 사거리로 돌아왔다.
이순신 동상 앞에는 높이 5미터의 거대한 컨테이너 차벽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주 촛불집회에서의 폭력사태를 의식한 듯 예비군들이 컨테이너 앞에 줄을 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비폭력 저지선까지 그어져 있었다. 시민들이 밧줄로 경찰버스를 끌어내곤 했던 새문안교회 골목에는 “명박이를 태우고 갈 차랍니다. 폭력은 쫌”이라는 우스꽝스런 문구의 플래카드가 걸려있기도 했다.
이날 광장은 여전히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술렁거렸지만 지난 집회와 다르게 무력감이 조금씩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70만명이 모여도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열패감 때문일 수도 있고 한달 이상 달려온 집회의 피로감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압도적인 컨테이너 차벽 때문일 수도 있다. 사상 최대의 집회였지만 열기는 눈에 띄게 식어있었다. 그 순간 컨테이너 차벽 앞에서는 거센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언제까지 축제만 즐길 것인가.” 20대 후반의 남성이 소리를 치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는 통에 토론에 큰 진전은 없었지만 이 남성의 주장은 “우리는 모두 명박이를 끌어내리려고 모였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구호 외치고 적당히 먹고 놀고 떠들다가 집에 돌아가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 집회를 위해서라도 오늘은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토론의 쟁점은 과연 우리가 서로에게 비폭력을 강요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특히 차벽을 넘거나 넘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다른 여성은 “진짜 폭력은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저 거대한 차벽”이라며 “비폭력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당신들은 비폭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비폭력을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차벽 앞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20대 중반의 남성은 “당신들의 행위가 우리 모두의 순수성을 왜곡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주 폭력 사태 이후 집회 참가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던 것 기억하느냐”며 “우리가 차벽 위에 올라가면 내일 조중동에 ‘촛불집회 폭력사태로 얼룩’이라고 기사가 나올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가 광장에 모인 순수성이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진짜 힘은 비폭력이고 자발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6월 항쟁에 참여했었다는 40대 후반의 남성은 “우리가 세종로 사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법이고 우리는 이미 폭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명박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였고 이미 합법과 불법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든 것을 과연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차벽을 걷어차기라도 해야겠다”며 차벽 앞을 막고 선 예비군들에게 물러서줄 것을 요구했다.
토론이 진행되는 와중에 뒤쪽 차벽 앞에서는 스티로폼 더미를 차벽 앞에 쌓으려는 사람들과 이를 말리려는 사람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일부는 “비폭력”을 외치면서 이를 말리고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당신들이 차벽 위에 올라가면 강제진압이 시작될 것이고 당신들 때문에 억울하게 다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며 분개했다. 이들은 나중에 토론에 함께 합류했다.
토론은 결국 스티로폼을 쌓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으로 바뀌었다. 스티로폼을 쌓고 차벽을 넘어가자는 사람도 있었고 차벽을 넘어설만큼만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 청와대를 향해 소리라도 쳐보자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스티로폼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결국 평화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의 동의를 얻게 됐다.
이날 스티로폼을 준비한 사람들은 인권단체연석회의 회원들. 이들은 “민주주의는 차벽을 넘는다”, “차벽은 인권침해다”라고 쓰인 조끼를 입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인 박래군씨가 마이크를 잡고 “경직된 비폭력을 넘어 우리의 분노가 저 거대한 차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결국 11일 새벽 한시께부터 사람들은 스티로폼을 쌓아 단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단상은 당초 기대와 달리 차벽을 넘어설만큼 높지 못했다. 차벽은 5미터 정도 높이였는데 단상은 4.5미터 정도에 그쳤고 게다가 “비폭력”을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차벽에서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됐다. 그러나 맨 위에 올라서면 차벽 너머가 내려다 보일 정도가 됐다. 한 시민이 커다란 태극기를 단상위에 꽂아놓았다. 시민들은 한 사람씩 올라가 청와대를 향해 자유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미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서로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데까지 나갔다는 사실이다. 다양하고 무질서하고 아무런 방향도 없어보이지만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이들은 차벽 앞에서 발길을 돌리거나 차벽을 굳이 물리력으로 무너뜨리지 않아도 차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스티로폼을 더 쌓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은 밤새 계속됐다. 컨테이너 높이까지 스티로폼을 더 쌓고 연단을 넓혀 마침내 콘테이너 위에 올라선 것은 새벽 5시. 시민들은 “소통의 정부, 이것이 MB식 소통인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콘테이너 차벽위에 올라가 깃발을 흔들기 시작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아무런 사고도 없이 차벽 시위는 평화적으로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