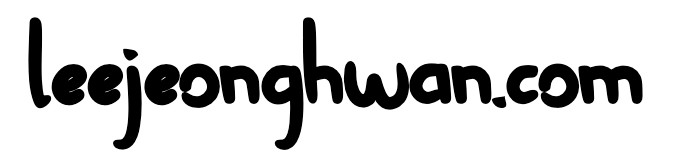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상천외한 해석을 내놓았다. 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자가 1만9760명인데 이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36.8%인 7276명, 계약종료가 37.0%인 7320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나머지 26.1%, 5164명인데 노동부는 이들을 ‘기타’로 분류했다. 정규직 전환도 아니고 계약종료도 아닌 이 ‘기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흔히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법률 가운데 하나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돼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다.
결국 조사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계약종료는 37.0%, 나머지 63.0%는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이든 자동적인 정규직 전환이든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 한때 100만 해고대란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10명 가운데 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당장 임금이 기존의 정규직에 맞춰서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해고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노동부는 “7월 계약기간 만료자 가운데 무기계약을 포함, 정규직 전환비율은 36.8%”라면서 “계약 종료자 및 기타 응답자까지 포함하면 고용불안 규모는 63.1%(계약종료 37.0% + 기타 26.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기간제한 규정 적용 이전과 이후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이미 정규직 전환된 상태라는 사실을 부정한 셈이다.
일단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종료 비율이 37.0%로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6월에는 이 비율이 30.5%였다. 정규직 전환 비율은 6월 38.8%에서 7월에는 36.8%로 줄어들었다. 6월과 비교하면 계약종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부가 100만 해고대란 가능성을 퍼뜨리면서 기간연장이나 폐지를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규모다.
이번 조사 결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38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08만명이라고 했던 통계청 조사와는) 조사방식과 시기가 달라 어떤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 회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기간제 근로자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주도해 만든 현행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혹은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노동부가 도리어 이를 어기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왜곡과 조작을 일삼으니 노동부가 ‘경총 노무관리부서’라는 조롱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런 식의 왜곡과 조작을 계속할 셈이라면 아예 노동부 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는 자발적 또는 자동적 정규직화가 노동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서 “노동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은 단기적으로는 정규직화 지원금 확충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사용사유 제한 도입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확산과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노동센터 정흥준 국장은 “정부가 기간유예나 폐지 가능성을 흘리면서 계약만료도 아니고 정규직 전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법적으로는 이미 정규직”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계도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했다면 정규직 전환 비율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일부에서는 소급적용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