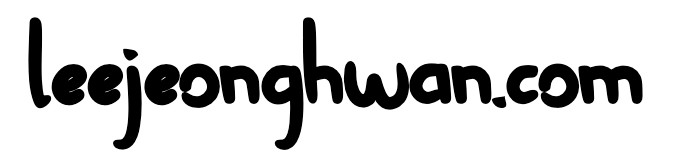법원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2년 가까이 끌어온 광주신세계 재판에서다. 이 사건을 재판으로 가져간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언론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정 부회장은 1998년 광주신세계가 2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때 이를 모두 인수했는데 2002년 광주신세계가 상장하면서 585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상장 이전 정 부회장의 지분은 83.3%나 됐다. 광주신세계는 1995년 처음 설립될 때만 해도 신세계가 100% 대주주였다. 그런데 대주주가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하고 이 실권주가 정 부회장에게 넘어가면서 정 부회장의 개인 회사처럼 돼 버렸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가. 삼성그룹의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나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이 자산을 늘린 수법과 정확히 같다. 알짜배기 비상장 계열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이 회사의 주주로 있는 계열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청약을 포기하고 그룹의 황태자가 실권주를 싸게 사들여 재산을 부풀리는 수법이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에버랜드, 현대‧기아차그룹에서는 글로비스, 그리고 신세계그룹에서는 광주신세계가 그 역할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비롯해 5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신주 인수의 당사자는 광주신세계”라며 “정 부회장의 신주 인수가 신세계와 관련한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볼 수 없어 경제개혁연대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1998년 25억원을 투자해 광주신세계의 지분 83.3%를 사들였다. 그리고 4년 뒤 광주신세계가 상장하면서 198억5천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확보했다. 6월18일 기준으로 정 부회장의 광주신세계 지분 평가금액은 1271억원m까지 불어났다. 만약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지분을 정 부회장에게 헐값에 넘기지 않았다면 1271억원은 신세계의 몫이 됐을 것이다. 그래프는 광주신세계 지분비율과 시가총액, 단위는 억원.)
이 재판의 쟁점은 광주신세계가 헐값에 발행한 신주를 왜 대주주인 신세계가 포기했느냐다. 정 부회장에게 지분을 넘기려고 의도적으로 실권한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그런데 법원은 신세계와 광주신세계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라는 엉뚱한 논리로 정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신세계는 광주신세계의 대주주고 정 부회장 일가는 신세계의 대주주다. 이 두 회사를 과연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헐값 발행도 논란이다. 정 부회장은 최대 1만9434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을 5천원에 사들였다. 만약 이 계산이 맞다면 신세계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자회사의 지분을 헐값에 내준 셈이다. 그때 25억원을 신세계가 직접 출자했다면 신세계는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을 텐데 신세계는 이를 포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주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됐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사가 합리적인 선택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애초에 정 부회장을 비롯해 신세계 이사회가 의도적인 실권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세계가 알짜배기 자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정 부회장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은 건 사실이지만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경 제개혁연대는 성명을 내고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100% 모자회사 관계였으므로 광주신세계 실권주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모회사인 신세계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라면서 “정 부회장이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법원은 실권주를 액면가로 제3자인 정 부회장에게 인수하게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신세계는 25억원을 출자할 여력이 있었는데도 갑자기 실권을 결정한 이유, 설령 실권을 결정했더라도 이를 실권 처리 하지 않고 정 부회장에게 넘긴 이유,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유 등을 법원은 판단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연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회장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경제개혁연대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아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재판 소식을 기사로 다뤘지만 단순히 정 부회장이 승소했으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재판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쳤을 뿐 재판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기사는 거의 없었다. 온라인판에 기사를 쓴 곳은 많았지만 오프라인판에 게재한 곳은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밖에 없었다. 그나마 경제개혁연대의 반론을 다룬 곳은 한겨레가 유일했다.